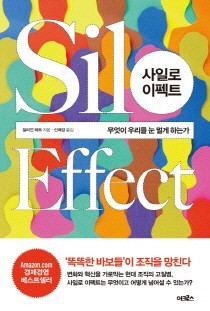- 칸막이에 갇힌 조직·기업
- 각자 업무만…큰 그림 못봐
- 금융위기 때 경제석학들
- 워커맨 신화 소니 몰락도
- 변화 눈멀게 한 '사일로' 탓
- 다양한 '점' 선으로 연결해야
- ………………………………
- 사일로 이펙트
- 질리언 테트|384쪽|어크로스
[이데일리 오현주 기자] “우리집에는 ‘소니’의 전자기기가 35개 있어요. 배터리충전기요? 그것도 35개지요.” ‘워크맨’ ‘플레이스테이션’ 등으로 빛나는 시절을 보낸 소니는 만족이란 걸 몰랐다. 수년에 걸쳐 제품라인과 사업부문을 문어발식으로 확장, 또 확장했다. 1000개 이상의 전자기기를 생산했고 대다수는 독립된 특허기술 기반이었다. 이렇게 잘나가던 소니가 어쩌다 몰락의 길을 걷게 된 건가. 기술? 아니다. 자본? 천만에. 정보? 엄청 많았지. 그렇다면? 폐쇄성이 문제였던 거다. 부서를 세분화하고 자율적인 팀을 만들자며 외부와의 소통을 끊더니 코앞에 닥친 위기까지 못 알아보게 됐다. 팀 중심의 방어적인 태도가 쌓아며 손에 쥔 혁신의 기회까지 차버리게 됐다. 결국 세상서 가장 폐쇄적인 집단이 된 것이다.
현대의 조직은 회의로 시작해 회의로 끝난다. 그것도 매일 ‘대책’회의다. 브리핑을 하고 책임자를 불러다 문책하고 다시 그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것도 모자라 태스크포스팀도 건별로 만든다. 그런데도 늘 신통치 않다. ‘위기상황’이 해제되는 법이 없고, 혁신? 그냥 풀리기만 해도 좋겠다. 바로 이것이 책의 문제제기다. 간단히 말하면 ‘그러니 어쩔래?’다.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에서 세계시장분석을 담당한 금융저널리스트가 이 골치아픈 문제를 ‘사일로 이펙트’로 풀었다. 사일로(silo)가 화근이란다. 제 아무리 똘똘한 친구들이 모인 집합체라도 구성원을 눈멀게 하고 조직의 변화를 가로막는 사일로가 도사리고 있는 한 혁신은 물 건너간 얘기라고 먼저 치고 나왔다. 원인이 잡혔으니 대책도 꺼내야 할 터. 저자는 크게 두 가지 분석을 통해 해결책에 접근한다. ‘어째서 사일로가 생기지’가 하나. 다른 하나는 은근슬쩍 생긴 사일로가 조직을 장악하기 전 ‘사일로를 길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다.
제목 ‘사일로 이펙트’는 주로 ‘부서 이기주의’란 말로 풀이된다. 생각·행동을 가로막는 편협한 사고틀과 심리상태 전반을 가리킨다. 각자의 업무에만 몰두하느라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혹은 보지 못한 척하는 현상 전부를 말한다. 결국 대책은 총체적인 지휘의 그림 아래 마련하는데 그것이 없다는 게 문제다. 작은 점과 점 사이 선을 보지 못해 모두 칸막이 안에 갇힌 채 아등바등하는 모양.
저자가 볼 때 사일로는 죽여도 죽여도 되살아나는 ‘좀비’와 비슷한 거다. 그런 좀비를 찾아 나선 저자의 발길은 어디 한군데 머물지 않았다. 마이클 블룸버그가 이끌었던 뉴욕시청과 뉴욕시의 블루마운틴 헤지펀드, 캘리포니아의 페이스북, 시카고 경찰국, 오하이오의 클리블랜드 클리닉, 런던의 잉글랜드 은행과 스위스의 UBS, 도쿄의 소니 등. 여기에 사일로를 이긴 그룹과 이기지 못한 그룹이 나뉘어 있다.
▲그들이 ‘똑똑한 바보’로 전락한 이유?
저자가 세상을 보는 기준은 간결하다. 사일로에 갇힌 세상과 사일로를 넘어선 세상. 먼저 사일로에 갇힌 세상을 한번 보자. 영국 런던정경대 최고 석학들이 2008년 세계경제위기 앞에서 눈뜬장님처럼 ‘똑똑한 바보’가 돼버린 까닭은?
이 복잡한 문제조차 저자에겐 쉽게 정리된다. 사일로 경제학자들 탓이니까. 당시 (물론 지금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지만) 경제학자들은 세계 외부에 존재하는 하찮은 ‘경제거리’에 대해선 깡그리 무시했고 다른 영역과 연결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경제학자의 고질병인 ‘경제학을 금융과 분리하는 습관’ 때문이다. 그저 수학방정식의 세부사항을 연구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 당연히 옆방에선 어떤 분류체계로 연구를 하는지, 나와의 사이에 경계는 없는지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진정한 ‘똑똑한 바보’였던 셈이다.
그렇다면 사일로를 넘어선 세상은 어떤가. 저자는 페이스북이 시도한 사회공학실험을 성공사례로 꼽았다. ‘전문가집단의 함정’에서 벗어나려 한 끊임없는 ‘벽치기’. 그렇다고 대단할 건 없다. 그저 직원들이 조직의 문제를 큰 그림에서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나가는 능력을 키우며 경험을 넓혀가는 것. 하지만 파장은 컸다. 사일로를 소탕할 수 있었으니.
▲조직의 운명? 사일로만 다스리면!
사일로에 갇힌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 뭐가 문제인지 파악조차 못하는 것이다. 혹여 알아챘다고 해도 문제로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어찌 보면 당연하다. 숲을 못 보고 나무에만 매달려 있으니 바람이 부는지 비가 오는지 도통 보이질 않는 거다. 스스로 만든 관료제나 분류체계 안에 생각·행동을 가둬버렸기 때문이다.
전문화와 집중화가 미덕인 시대. 하지만 그 미덕이란 것이 전혀 다른 세상에 있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사일로가 획책한 ‘’사일로 이펙트‘를 눌러야 전문·집중화의 경계를 넘어 협력의 시너지를 키울 수 있단 뜻이다. 기업의 미래? 국가의 운명? 저자의 논리대로라면 이조차도 그리 거창할 게 없다. 사일로만 잘 다스리면 되니까.
저자가 던진 한방의 처방전이 있다. ‘외부인의 시각을 가진 내부인’을 키우란 것이다. “때때로 우린 세계를 조직하는 다른 방법을 상상할 수 있다”가 진짜 미덕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남의 식구처럼 이상한 소리를 해댄다고 내칠 일이 아니란 거다.
▲조각조각의 점을 이어라
테러·붕괴 같은 인재든 지진·태풍 같은 자연재해든 별반 다를 게 없다. 보통 대형 사건·사고가 터질 때마다 나오는 말썽거리는 점과 선을 잇지 못하는 국가시스템이란다. 사고를 예고한 점을 연결하지 못하고 관련부처 간 벽을 부수지 못할 때 참사는 이어지게 돼 있단 거다. 예컨대 9·11테러의 진상을 파악하는 과정. 1000여명을 인터뷰하고 한 달 가까이 청문회를 하며 160명의 진술을 들었다. 그렇게 250만쪽의 보고서를 만들었다. 그래서 어쩔 건데? 결론은 테러를 예고한 조각조각의 정보를 연결하지 못한, 부처 간 따로놀기식 칸막이 때문에 벌어진 참사라고 나왔는데.
저자가 빼낸 간명한 해결책은 이거다. ‘다양한 점을 이어라’(Connecting the dots!). 이는 스티브 잡스 전 애플 CEO가 어느 해인가 스탠퍼드대 졸업식에서 축사로 꺼내놔 유명해진 말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죽은 잡스라도 데려와 칸막이를 젖히고 수많은 점을 연결하라는 것이다. 소니, 페이스북 등 기업조직의 흥망성쇠는 물론이고, 9·11이든 구제역이든 세계금융위기든 정치·사회·금융분야라고 제쳐둘 일도 아니다.
‘배터리충전기 35개’가 소니에만 해당된 일로 끝나리란 보장은 없다. 사일로로 인해 몰락하는 기업의 폐품은 어디 내다팔 수도 없다.
오현주 (euanoh@edaily.co.kr)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8&aid=0003633756&viewType=pc